공지 / 공고
추모문화제 안내
- 퓰리처상 프리드먼의 추모 "김영희 대기자 인터뷰, 영광이었다"
- 관리자
- 2020-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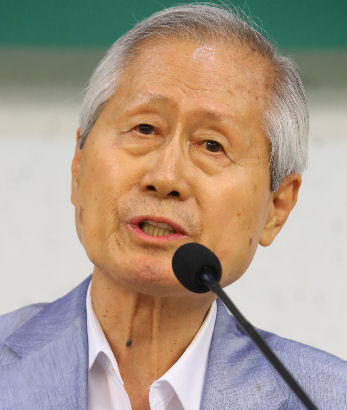
고(故)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의 부인 박영애(77) 여사는 17일 남편의 입관식을 마치고 돌아와 본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생전에) 수의 입고 가는 게 싫대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손수건 다 골라두고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입혔어요.”
박 여사는 양복을 입고 관에 누워 있는 남편이 좀 추워 보여 평소 산책할 때 즐겨하던 머플러를 목에 둘러줬다고 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가지런한 양복 차림을 즐겼던 고인은 마지막 길까지 예의 꼿꼿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 듯 했다.
고인은 15일 평소처럼 오침(午寢)을 청한 후 영면에 들었다. 박 여사는 “낮잠이 길어져 방에 들어갔더니 양 입꼬리가 올라간 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며 “생전 안 웃던 사람이 좋은 꿈을 꾸시는구나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15일부터 사흘 내내 각계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강경화 장관, “큰 별이 지셨다”…반기문·서훈 등 발걸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김 전 대기자의 부음을 듣고, 이튿날 첫 일정으로 고인을 조문했다.
강 장관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큰 별이 지셨다”며 위로했다. 박 여사가 “고인이 평소 장관께서 어려운 시기에 큰 일을 맡았다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자, 강 장관은 “(고인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했다. 강 장관과 고인은 청와대 주재 원로자문단 오찬 등에서 잠깐씩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고인과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한국 외교 역사를 함께 걸어온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17일 늦은 밤에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로하려는 인사들의 조문으로 장례식장이 가득 찼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이 잇따라 발걸음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뵐 때마다 해주시던 고인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생생하다”며 “남북관계에 관한 균형이 잡히고 혜안이 담긴 글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정동영(민주평화당)·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가수 최백호, 소리꾼 장사익 등 정·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를 망라해 고인과 인연을 맺은 각계각층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송민순·윤병세 역대 장관들 빈소서 "외교의 산 증인"
국제관계 대기자로 명성을 떨치며, 한국 근현대 외교사(史)를 빼곡히 기록했던 고인의 족적에 따라 빈소에는 유난히 외교 인사들의 얼굴이 많이 보였다.
노무현·박근혜정부에서 각기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윤병세 전 장관은 16일 장례식장을 찾았다. 송 전 장관은 “현역 시절 김 전 대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 내가 오히려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며 “고인이 던지는 질문 속에 답이 있을 때가 적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윤 전 장관도 “한국 최초의 국제관계 대기자인 고인은 대한민국 외교의 산 증인이었다”며 “철학과 경륜을 갖고 외교 문제를 분석했기에 현장 외교관들도 그 분의 번뜩이는 지혜를 실제 정책에서 많이 참고했다”고 기억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기자이자 논객을 잃었고, 한반도는 이 시대 최고의 남북통일 사상가를 떠나보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위대한 사상가 잃어"…프리드먼도 추모 메일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도착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본지에 e메일을 보내 “현명하고 위대한 사상가를 잃었다”며 “고인은 매우 도덕적이고 강직했던 기자였다”고 추모했다. 차 석좌는 고인보다 25세 어렸지만 두 사람은 생전 서로를 ‘영희’와 ‘빅터’라고 이름 부르며 세월을 뛰어넘어 소통했다. 차 석좌는 “그가 너무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NYT)의 스타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도 고인을 추모하는 e메일을 본지에 보내왔다. 2017년 방한 때 초청 측에 “김영희 대기자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던 프리드먼은 당시 김 전 대기자를 만나 “60년 가까이 현장에 있다는 게 놀랍다”며 “당신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어 영광”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영어로 번역된 고인의 칼럼을 읽으며 깊은 사고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기자는 프리드먼에게 "기자 생활동안 만났던 이들 중 몇 명을 선정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도 펴낼 예정"이라며 "그 중엔 톰 당신도 들어간다"고 귀띔했었다. 프리드먼은 e메일에서 이 내용을 상기하며 "나로선 영광이었다"며 "(고인이 돌아가셔서) 책을 못 읽게 된 게 아쉽다"고 전했다.
박한식 전 조지아대 석좌교수도 본지 측에 전화를 걸어 “미국에서 김 전 대기자의 사망소식을 확인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고인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견해도 끝까지 들은 뒤 좌와 우를 넘어선 합리적 결론을 내리려는 신중한 분이셨다“고 떠올렸다.
백두산 함께 등정했던 장사익 <귀천> 들으며 영면
소리꾼 장사익씨는 17일 오전 빈소를 찾았다. 장씨는 “2015~16년 중앙일보의 <평화 오디세이> 행사에서 백두산을 등정하며 고인과 가까워졌다”며 “세상의 어려운 일을 앞서 고민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곡 <귀천>을 노래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출처: 중앙일보





